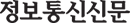![지난해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 결과 관련 매출이 2018년부터 3년간 연평균 39.2%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https://cdn.koit.co.kr/news/photo/202112/91857_43298_4546.jpg)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해 무인이동체 매출이 6784억원을 기록해 3년간 연평균 39.2%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66.5%가 정부 및 공공기관 매출로 나타나, 정부 정책 지원이 가장 큰 성장 요인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은 ‘2020년 무인이동체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인이동체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체로, 드론‧무인기(공중), 무인지상차량(육상), 무인선박‧잠수정(해양) 등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국내 육상-해상-공중 분야 무인이동체 사업을 영위한 3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무인이동체 기업 308개사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6784억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9.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과기정통부]](https://cdn.koit.co.kr/news/photo/202112/91857_43300_1719.png)
2018년 3640억원(233개사)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6784억원(308개사)까지 올랐다.
분야별로는 공중 분야가 5484억원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고, 육상 811억원(12.0%), 해양 407억원(6.0%), 카메라 등 임무장비(1.2%) 82억원 순이었다.
전체 매출액 중 66.5%(4515억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해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기업 20%(1356억원), 기타 13.4%(912억원)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43.2% 매출(1462억원)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민간기업 37.3%(1264억원), 기타 19.6%(666억원)의 비중을 보였다.
조사대상 기업의 무인이동체 종사인력은 3131명이었으며, 기업당 인력은 10.2명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8.2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국내 무인이동체 인력은 주로 공중 분야 76.0%(2384명) 및 R&D 직무 68.1%(2132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과기정통부]](https://cdn.koit.co.kr/news/photo/202112/91857_43301_1744.png)
학력별로는 학사 이상이 전체 92.6%(2901명), 석/박사 비중은 28.1%(882명)이었으며, 전공은 전기·전자/IT가 전체 42.4%(13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항공우주 전공순이었다.
향후 5년간 신규 수요인력이 2499명 필요하다고 응답해 연평균 500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채용시 가장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은 기체설계 및 조립(66.9%), 시험평가(54.5%), 탑재SW(50%) 순으로 조사(중복 채택)됐다.
2020년 무인이동체 분야 기업 관련 총 1328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3년까지 5021억원의 투자가 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투자는 기업 자체 75.9%(1008억원), 정부지원 24.1%(320억원)로 조사됐고, 총 투자의 76.4%(1015억원)가 R&D 분야에 집중됐다.
향후 3년간 무인이동체 관련 5021억원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부문별 투자 우선 순위는 R&D 76.1%(3819억원), 시설·장비 20.4%(1023억원), 교육·훈련 3.2%(160억원)순으로 전망된다.
![[자료=과기정통부]](https://cdn.koit.co.kr/news/photo/202112/91857_43302_182.png)
국내 기업의 무인이동체 사업 업력은 대부분 5년 이하이며,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다.
무인이동체 사업 업력 5년 이하의 기업이 65.9%로 대다수였으며, 업력이 10년 이상 된 기업은 9.7% 비중에 불과했다.
기업 3곳 중 2곳인 62.3%의 기업은 자체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장 소재지는 절반 이상인 58.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충청권(49개, 15.9%)이 수도권 다음으로 많았으며, 경상권(48개, 15.6%), 전라권(23개, 7.5%), 제주권(4개, 1.3%), 강원권(3개, 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원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 과장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의 R&D 과제들이 완료되는 2020년대 후반쯤 내실 있는 성장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며, “아직 국내 무인이동체 시장이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바, 민간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서비스 등 사업모델 개발‧확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