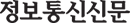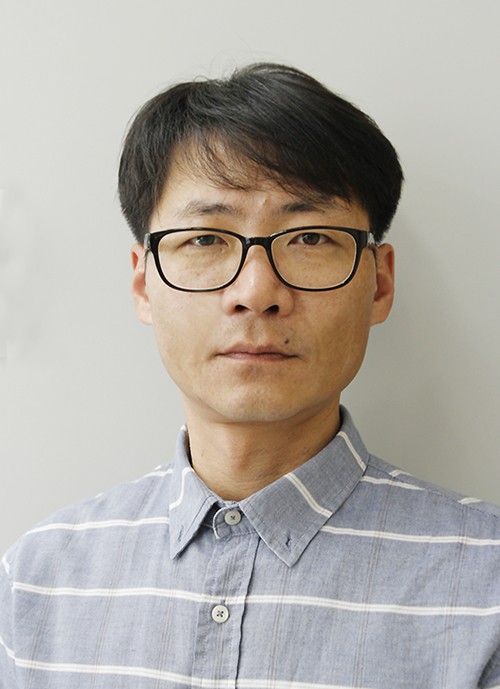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햇살 가득한 여름, 너나 할 것 없이 가수 ‘비’가 되곤 했다. 대기 중인 보행자 신호등 앞에서 각자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영업 중인 상점의 어닝 아래,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 오픈형 매장 앞, 지하철 계단 끝자락, 건물 입구 등등 한뼘의 그늘과 시원함이 있어도 그곳은 우리의 안식처였다.
지금이야 주요 신호등에 스마트 그늘막이 드리워져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몇초 후면 바뀐다고 알려주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신문물은 상상 밖 물건이었다.
그만큼 기술과 아이디어가 발달하면서 실생활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오늘도 몸을 맡긴 스마트 그늘막은 ‘도심 속 오아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인터넷(IoT)과 태양광 기술을 더해 한층 진화 중이다. IoT 기술이 적용돼 주변 온도, 바람의 세기, 일조량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그늘막이 펴지고 접힌다.
스마트 그늘막은 스스로 주변 온도를 감지해 일정한 온도가 되면 펼쳐지고 접히는데,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진다. 보통 때는 해가 뜨는 아침 7시에 펼쳐지고 해가 지는 저녁 8시에 접히도록 설정된 경우가 많다.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뿐만 아니라 바람에도 반응한다.
태풍 등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 풍속 센서가 바람의 세기를 감지한다. 풍속이 초당 7m 이상 몇초간 지속하면 자동으로 접히도록 설정되거나 풍속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15분 뒤 다시 펼쳐진다.
설정 방식은 스마트 그늘막 설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그늘막 위쪽에 설치된 태양광 전원 공급 장치는 친환경 청정에너지 시설로, 그늘막을 펴고 접을 때와 발광다이오드(LED) 빛을 발할 때 전력을 공급하기도 한다.
스마트 그늘막을 처음 접했을 때 구청에서 CCTV를 보면서 원거리로 작동하고 있나 싶었다.
그러나 엄청한 기술을 몸에 지닌 녀석이란걸 알았을 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겉모습만 봐서는 이 녀석에게 그런 재주가 숨어있으리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신기한 녀석은 밤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의 경우 ‘보안등’으로 변신해 시민의 발길을 비춰주기도 한다.
일상에 스며든 스마트 기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가까운 공원을 찾아가보면 곳곳에 신기술이 접목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 벤치, 스마트 키오스크가 공원 이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스마트 센서와 CCTV,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활용돼 공원 시설물 관리와 안전문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민원이 잦은 상업지역, 역사 주변 등의 빗물받이에 QR코드를 부착하면,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인식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인 침수 대책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각종 센서와 통신 기술이 묶인 ‘연결의 사회’에 살고 있다.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은”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만큼 그에 대한 이해도 빨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생활이 불편해 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남들과는 다른 보폭으로 뒤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새로움에 익숙해지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