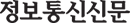[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누군가 말했다. 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인간의 게으름에 있다고.
집에 들어와 스위치 하나 켜는 것조차 귀찮아서 조명이 알아서 켜주길 바라는 그 마음, 한때 스마트 조명에 꽂혀서 사물인터넷(IoT) 연결이 되는 조명을 대거 구입한 적이 있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알아서 켜지는 것은 물론이요, 잠이 들 무렵이면 알아서 소등하고 깨야될 시간이면 은은한 불빛으로 날 깨운다. 조명만으로 무언가 럭셔리한 생활이 가능하리라는 판타지가 있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가장 유명하다는 제품을 골랐다. 필자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지 ‘스타터 키트’라는 세트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렇게 첫 스타트는 주방 식탁 조명으로 끊었다.
신세계였다. 조명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졌다. 특히 독서, 휴식, 식사, 놀이 등 내가 무얼하고 있느냐에 따라 최적화된 조명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욕심이 생겼다. 거실, 화장실, 모든 방을 스마트 조명으로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회사는 ‘스타터 키트’에서 확장할만한 더 다양한 추가 액세서리들을 구비해 놓았다.
그런데 제품의 디자인이 썩 맘에 들지 않는다. 스마트 조명을 파는 회사가 어디 그 곳뿐이랴. 별의별 사이트를 다 뒤져 가족들의 취향과 우리 집에 최적화된 라인업을 완성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음은 모른 채.
여러 제품을 모아보니 조명들은 전혀 스마트하지 못했다. 온 집안의 불빛을 휴대폰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각각의 제품은 각각의 방식으로 다뤄달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제법 많은 제조사의 제품이 서로 연동된다고 안내가 돼 있었지만 왜 내가 산 회사 제품만 빠져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나일땐 몰랐지만 여러 제품을 통신 연결하는 것도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그 역시 어떤 건 블루투스, 어떤 건 와이파이, 어떤 건 듣기에도 생소한 UWB였나. 거의 전문가가 되지 않고서는 제품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조차 없었다. 한마디로, 표준의 부재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샀냐는 가족들의 핀잔에 스마트 라이프를 향한 꿈은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조명들은 조용히 잡동사니를 모아두는 서랍으로 치워졌으니,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다.
10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상황은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조명뿐만 아니라 온갖 가전들이 ‘연결’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능들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집은 몇이나 될까.
보다 못한 빅테크들이 나서서 내놓은 것이 ‘매터(Matter)’ 표준이다. 스마트홈 기기용 개방형 통신 프로토콜로서, 그간 난립했던 스마트홈 표준을 통합할 구원투수다.
필자가 직접 매터 제품을 써보진 않았지만 연결에서부터 사용까지 매우 편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건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을 만큼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매터를 지원할 것인가다.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에 따르면, 최초 매터 인증이 부여된 2022년 10월 이래 약 5800여건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인증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데 있다. 전체 인증 건수의 63.8%인 3724건의 인증이 중국 제품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면 국적이 무슨 상관이랴. 하지만 중국산이라면 보안 측면에서 께름칙한 것이 사실이다. 스마트홈에서 보안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자연스레 국산 제품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싶지만, 중국 제품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LG전자가 가장 많은 인증 건수를 기록했는데 29건이다. 그 뒤를 삼성전자 22건, 고퀄 11건, 에이솔루션 7건, 와츠매터 5건 등이 잇고 있다. 사용자 입맛대로 국산 제품을 사용한 스마트홈의 꿈은 아직 묘연해보인다.
한 두 기업이 잘해서 될 리가 없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장이다. 고질병이었던 표준 문제도 매터의 등장으로 해결되는 추세이니 업계를 하나로 묶을 강력한 구심점이 마지막 퍼즐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