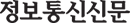[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한번 사면 대학교 때까지 쓸 수 있는 컴퓨터!”
4, 50대 아재 정도는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문구다. 가슴 한 켠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 이름, ‘알라딘’이다.
‘알라딘’ 컴퓨터는 90년대 초반 당시 돈으로도 100만원을 호가하던 어마무시하게 비싼 물건이었다. 말그대로 대학교 때까지 쓸 수 있을 정도라 해야 어필이 됐다. 필자도 거의 1년을 졸라 산 기억이 있다.
12㎒의 CPU(㎓가 아니다), 1MB의 메모리에 무려 40MB에 달하는 하드디스크 용량은 과연 내가 이 하드디스크를 살아 생전에 다 채울 수 있을까 가슴 두근거리며 온갖 게임을 복사해 넣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기술이란, 지수 함수의 곡선을 그리며 발전하는 것인지라 ‘알라딘’은 대학교는커녕 초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폐급 물건이 되어 베란다로 치워졌다.
30여년이 지나 이제는 ‘알라딘’의 수천, 수만배 성능의 PC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구현되고, 인공지능(AI)을 담은 PC가 출시되는 시대다.
특히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AI PC의 잠재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바다.
얼추 기본 장착된 기능만 봐도, PC가 알아서 파일을 찾아주고 이전 작업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그림을 뚝딱 그려준다. 듣도보도 못한 나라의 언어를 실시간 번역해주기도 한다.
AI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지금이 이 정돈데 현재 스마트폰 앱 생태계만큼 AI 앱이 활성화되면 어떤 서비스들이 우리네 삶을 바꿔 놓을지 가늠이 안 된다. 이쯤되면 ‘알라딘’ 입장에선 마법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딘’ 시절 플로피디스크를 바꿔 끼우는 순간의 그 가슴 떨림이 그리운 건 왜일까. 드르륵 드르륵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로도 컴퓨터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던, 그것은 마치 컴퓨터와 나의 대화와도 같은 것이었다.
PC는 성능을 얻고 로망을 잃었다. 아니, 그냥 내가 아재가 다 된 거다.